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지리산, 한라산에서 주로 자생하던 구상나무는 변해가는 기후로 집단 고사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구상나무가 이 위기를 벗어나 다시 푸른 숲을 꾸려낼 수 있을까.
구상나무는 한국에서만 자생하는 특산수종이지만, 수려한 외관으로 외국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로 애용되면서 '한국 전나무(Korean Fir)'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됐다.
해발 1500m 고지대에서 주로 살아가며, 잎사귀 뒷면은 은은한 흰빛과 은빛이 돌고, 솔방울은 자주빛을 띈다.

구상나무가 한국 특산종이라는 사실은 외국의 한 박사에 의해 밝혀졌다. 1917년 한라산을 방문한 영국 어니스트 헨리 윌슨(Ernest Henry Wilson) 박사는 한국의 구상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다르다는 점을 알아챘다.
당시 제주도에서는 구상나무에 맺힌 솔방울이 성게를 닮았다 하여 제주도 방언으로 성게를 뜻하는 '쿠살'에 나무를 뜻하는 '낭'을 합해 '쿠살낭'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이를 보고 구상나무라고 이름을 지었다.
윌슨 박사는 1920년 아놀드식물원 연구보고집에 한국에서 발견한 구상나무의 정식 학명을 아비스 코리아나(Abies koreana)로 보고했다.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구상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세계 각지의 가정집에서 연말을 함께 보냈다. 2012년 국립생물자원관 조사에 따르면 국외에서 개량돼 판매되고 있는 구상나무 품종은 90여 개에 달한다.

해외에서 개량된 품종들은 이렇게 잘 팔리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 자생하던 구상나무는 푸른 빛을 잃고 하얗게 바래며 집단 고사하는 일이 잩아지고 있다. 2013년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등급에서 위기(EN) 단계로 지정됐다.
구상나무는 멸종위기로 분류될만큼 빠르게 고사하고 있다. 2019년 산림청의 전국 실태조사에서도 전국 구상나무 쇠퇴율은 33%에 달했다.

그 주요 원인으로는 기후위기가 지목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2017~2018년 2년간 지리산에서 고사된 구상나무 나이테를 분석한 결과 1945년부터 생육 스트레스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기후위기로 인한 기온 상승이 적설량을 감소시켰고, 수분 섭취 방해로 이어져 구상나무가 고사할만큼의 생육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구상나무 보호 노력은 각종 실험 및 연구와 현지 내·외 생태 보존 등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 중 지리산, 한라산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구상나무가 경남 거창군 금원산에서 순조롭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김대현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생태수목원담당자는 28일 뉴스펭귄에 "구상나무가 원래 자라고 있던 장소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두 군데에 식재를 했다"라며 "밖에서 양묘한 구상나무를 자생지에 심었을 때 잘 살아남을 수 있는지 실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원산에 식재된 구상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지 묻자 "잘 자라고 있다. 다만 어린 구상나무는 환경 적응력이 좋은데 10~20년 뒤에도 잘 자라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기후위기에 고지대는 저지대에 비해 더욱 높은 기온 증가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고지대에서 고사하고 있는 구상나무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그곳에 어린 묘목을 식재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
기존 한라산, 지리산 구상나무 군락지가 아닌 다른 환경을 탐색하는 시도는 서천에 위치한 국립생태원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국립생태원은 구상나무 씨앗을 발아시켜서 자라게 하는 작업을 2년가량 이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상나무 고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생태원 야외식물부 관계자는 30일 뉴스펭귄에 "그동안 식재된 구상나무 군락 규모는 약 2671㎡이며 개원 초기에는 약 170주를 식재했다. 지난해에는 40여 주를 추가 식재했지만, 많은 수가 고사해 남아있는 구상나무는 약 50주"라고 말했다.

고사 이유에 대해서는 "서천 국립생태원이 있는 곳은 해발고도가 낮고 더운 지역이라서 고사를 많이 했다. 그래서 추가 식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린 구상나무 묘종이 상대적으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편인지 묻자 "(구상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파종을 해서 서천 기후에 순응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구상나무 보존에는 현지 내 보존이 있고 현지 외 보존이 있는데, 보존적인 차원에서 서천 기후라던지 다른 기후에 순응을 시켜서 보존을 하려는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지 내 보존은 지리산, 한라산 등에서 이뤄진다.

배아줄기세포로 구상나무가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김동욱 국립생태원 선임연구원은 29일 뉴스펭귄에 "작년에 이어 대량 배양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라며 "대량 배양을 한다고 해서 바로 구상나무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배아줄기세포가 만들어지면 분자생물학적인 툴로 연구를 하는데, 이 실험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상나무는 성장이 굉장히 느리다. 2~3년을 키워도 키가 대략 10~15cm이고 줄기는 이쑤시개보다 살짝 굵은 정도다. (그런 작은 크기로) 실험하기는 어려우니까 유용한 실험을 위해 배아줄기세포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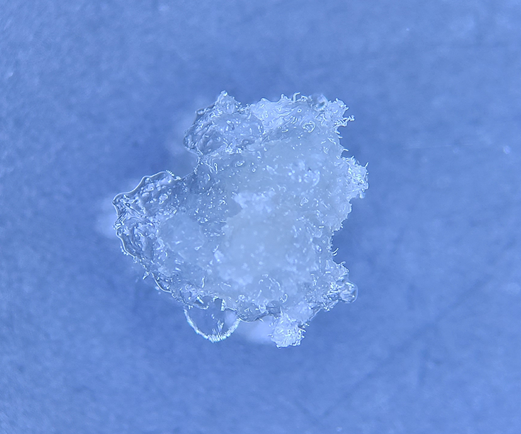
국립생태원 측은 배아줄기세포 실험으로 기후위기에 견딜 수 있는 구상나무 종자가 개발되면 식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아직 머나먼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상나무 씨앗을 발아시켜 식재하는 분들도 많다. 그런 방법과 비교해봤을 때 배아줄기세포는 실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당장의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구상나무를 보존하려는 방안에 대해 "대부분이 씨앗을 많이 발아시켜서 식재하거나, 생물학적으로 기후위기를 조금 더 잘 견딜 수 있게 개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도 구상나무 보존을 위한 회의가 국내에서 열렸다. 2일 산림청은 중부대전청사에서 지리산 구상나무 보존 및 복원 시범사업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임상섭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성공적인 구상나무 보전・복원을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점검과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필요하다"라며 "산림생태계 변화의 중요한 지표인 지리산 구상나무를 성공적으로 복원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시흥시에는 바다거북을 날개에 품은 잠자리가 산다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토종 명견 '제주개'를 아시나요?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국내 유일 멸종위기 해조류, 삼나무말을 잊지 말아요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오후 세 시가 되면 팝콘처럼 꽃 피우는 대청부채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신라시대 치장물에 전라도 '비단벌레'가 사용된 이유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한국 산지서 사라지면 멸종하는 '금강초롱꽃'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삵, 안산갈대습지 터줏대감 되다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 제주·남해 '나팔고둥'의 비밀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지구가열화로 북진 중" 보은·괴산에 나타나는 동박새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서울 도심 속 남산공원에 사는 '멸종위기 쌍꼬리부전나비'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한국 특산종' 구상나무, 다시 푸르러질 수 있을까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충남 서산, 점박이물범 지키는 '이 조례'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신안 고유종 참달팽이의 수난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2년 후 컴백 홈...' 비밀 밝혀진 이 새, 안산 '시조(市鳥)'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울릉도 바다에 해마가 산다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수백년 간 희생된 사향노루, 인제군에 도사린 위협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동글동글 귀여운 눈의 작은 뱀, 제주에만 있지비!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사라졌던 토종여우, 영주에 돌아오다!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美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신은 샌들, 광릉에도 있다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비둘기 품격은 내가 지킨다!' 100마리 남은 우리나라 토종 양비둘기
- [우리 고장 멸종위기종] 미지의 곤충 수염풍뎅이,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