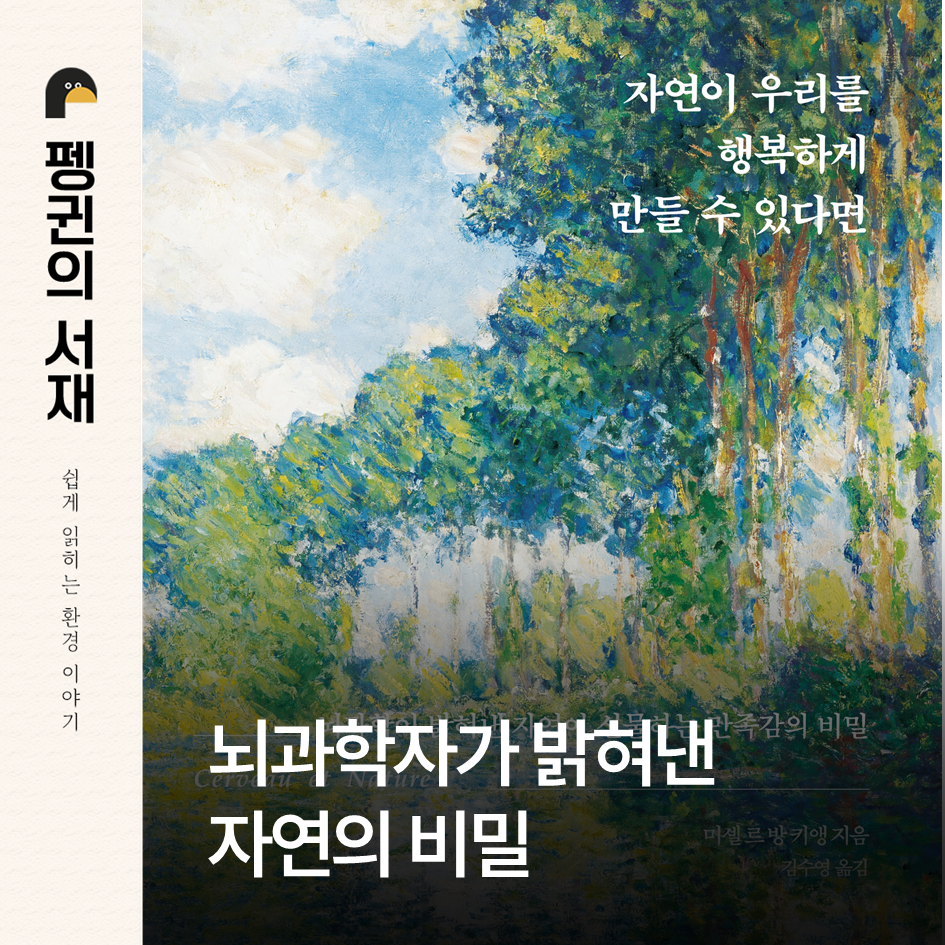
도시의 회색빛 일상에 지쳤을 때, 우리는 왜 본능처럼 숲을 걷고 바다를 찾을까?
프랑스의 저명한 뇌과학자 미셸 르 방 키앵은 이 질문에 신경과학으로 답한다. 코로나19로 자연과 단절되었던 팬데믹 시기, 그는 ‘자연의 부재’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 몸소 체감했고, 이를 계기로 자연이 인간의 몸과 마음에 주는 영향력을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다. 그 결과물이 『자연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면』이다.
자연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회복의 주체임을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신경과학·생리학·환경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최신 연구를 종횡무진하며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예컨대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가 인간의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고, 면역세포 활동을 50%나 끌어올린다는 일본 연구가 있다.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이틀 뒤, 심지어 한 달 뒤에도 유지된다는 점이다. 단지 숲길을 걸었을 뿐인데도 말이다.
그렇다면 자연이 행복감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자는 이 질문에 ‘바이오필리아’, 즉 자연을 향한 인간의 본능적 애정이라고 답한다. 인간은 자연과 함께 진화했고, 자연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는 생리적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은 숲속을 산책한 실험 참가자의 뇌를 스캔한 결과, 불안과 강박을 유발하는 전대상피질의 활동이 뚜렷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도시를 걸었던 집단의 전대상피질은 과잉 활성화되었다. 자연은 불안을 낮추고, 도시는 오히려 불안을 자극한다는 결과다.
이 책은 과학의 언어로 자연의 치유력을 말한다. 저자는 “아름다운 자연을 마주했을 때 숨이 멈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라고 묻는다. 일몰, 별이 촘촘히 박힌 하늘, 푸른 계곡을 바라보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닌, 뇌가 반응하고 있는 실질적인 생리현상이라는 것이다. 책은 우리가 자연을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진정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준다.
책 속에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자연의 11가지 치유 메커니즘’도 등장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흙이다. 흙에는 항우울 효과를 가진 박테리아가 살고 있는데, 피부나 호흡을 통해 체내로 들이기만 해도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다. 저자는 아이들이 옷을 흙투성이로 만들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라고 말한다. “자연이 신체와 뇌에 주는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도시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이 자연을 만나려면 강원도 깊은 숲이나 제주 바닷가를 가야만 할까? 책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창밖의 나무, 사무실 화분, 새벽녘 햇빛 한 줄기 같은 ‘손바닥만 한 자연’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건, 자연을 자주 접하고 자연에 집중하는 우리의 태도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 [펭귄의 서재] 도시는 회색일까, 초록색일까?
- [펭귄의 서재]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결국 소각? 두 개의 법이 만든 아이러니
- [펭귄의 서재] 길고양이에게 ‘주민등록’이 필요하다면?
- [펭귄의 서재] 나무가 인간을 구원한다
- [펭귄의 서재] 이끼가 가르쳐준 생태 언어
- [펭귄의 서재] 내 식탁이 정의로워야 할 이유
- [펭귄의 서재] 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 [펭귄의 서재] 한 플로리스트의 계절 환대법
- [펭귄의 서재] 교실에서 열린 기후소송?
- [펭귄의 서재] 뇌과학자가 밝혀낸 자연의 비밀
- [펭귄의 서재] 오늘의 날씨는 상상이 될까?
- [펭귄의 서재] 횟집 수조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 [펭귄의 서재] 늪에서 배우는 놀라운 생명의 언어
- [펭귄의 서재] '기후위기 식탁'에서 살아남는 방법
- [펭귄의 서재] "누군가 하겠지"의 '누군가'가 되기로
- [펭귄의 서재] 염치없는 한 시인의 저작권
- [펭귄의 서재] 기후 우울증 환자 주목!
- [펭귄의 서재] 그때도 지구는 녹고 있었다
- [펭귄의 서재] 감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어
- [펭귄의 서재] 코앞에서 시작하는 순환하는 삶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