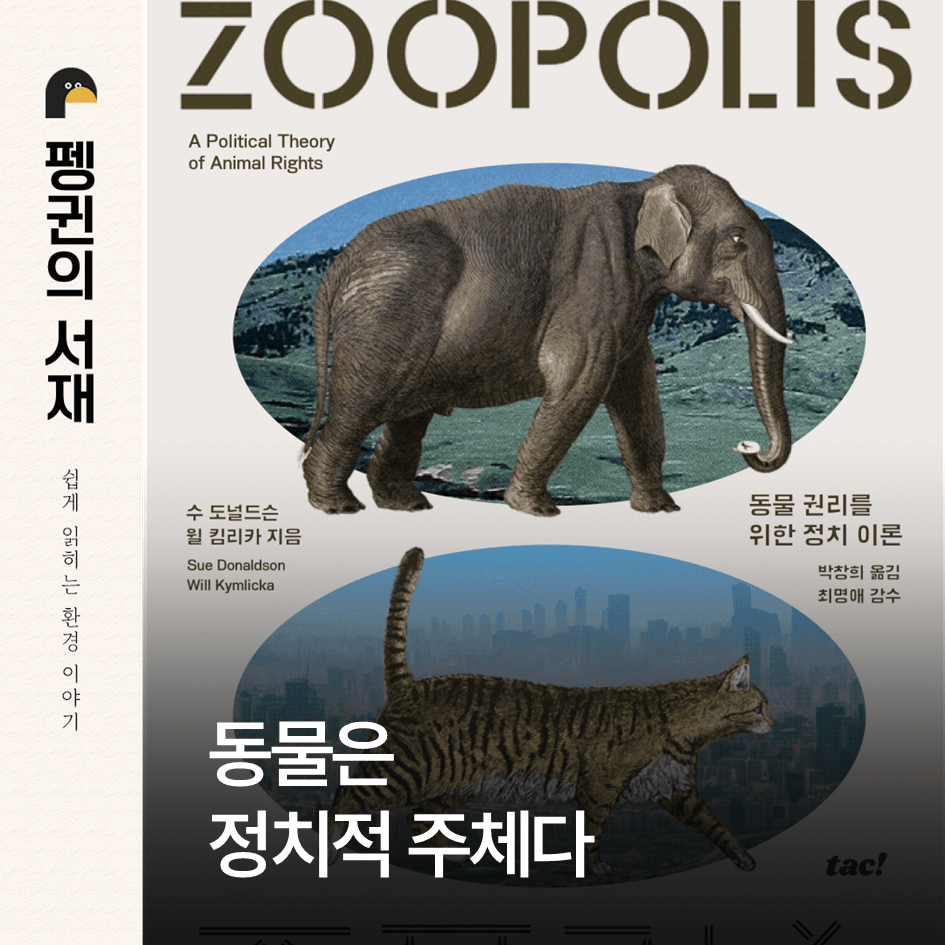
만약 길고양이가 ‘이 도시의 주민’이라면 어떻게 될까? 야생 멧돼지에게 ‘주권’이 있고, 농장 동물에게 ‘시민권’이 있다면? 황당하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이 질문은 재개발 지역 고양이 이주, 야생동물 관리 논쟁, 멸종위기종 복원사업 등 문제와 연결돼 우리 주변 곳곳에서 이미 던져지고 있는 것이다.
질문을 바꿔보자. ‘동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가 아니라 ‘동물에게 어떤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로. 이 질문에 대담하고 논리적으로 답하는 책이 수 도널드슨·윌 킴리카가 쓴 《주폴리스: 동물 권리를 위한 정치 이론》이다. ‘피터 싱어 이후 가장 중요한 동물권 저작’이라는 평가를 듣는 이 책은 동물을 더 이상 ‘보호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치 공동체를 구성하는 시민’으로 끌어올린다. 동물의 운명을 연민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제도·법·시민권 체계를 통해 보장하자고 제안한다.
《주폴리스》가 제시하는 핵심은 간단하다. 동물에게 시민권·주권·주민권을 부여하자. 인간과 밀접하게 살아가는 사육동물에게는 시민권, 인간 영향권 밖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에게는 주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길고양이·비둘기 등 경계동물에게는 주민권을 주자는 것이다.
특히 ‘경계동물’은 이 책의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다. 도시에서 늘 함께 살지만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던 존재들. 법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정책은 늘 배제해 왔다. 그 빈자리에 ‘이 도시의 정당한 거주자’라는 이름을 붙이자는 것이다.
그동안 동물권은 학대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와 같은 소극적 권리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은 이미 얽혀 살며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분리할 수 없는 사회적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동물권을 도덕이 아닌, 정치의 문제로 가져온다. 동물은 보호받는 대상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협상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한국 사회는 이미 책인 던지는 질문에 들어와 있다. 재개발 지역 고양이 이주 사업,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논의, 반려동물 등록제 확대, ‘동물은 물건’이라는 민법 문장 개정 시도 등 이 모든 현장은 ‘동물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이 아니라 ‘동물은 어떤 권리를 가진 사회 구성원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에 가깝다.
기후위기와 도시 확장으로 야생동물이 도시로 밀려오고, 멸종위기종 복원 사업이 지역 갈등을 부르고, 사육동물의 삶은 산업과 윤리의 충돌 지점에 서 있다. 동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분명 정치적 결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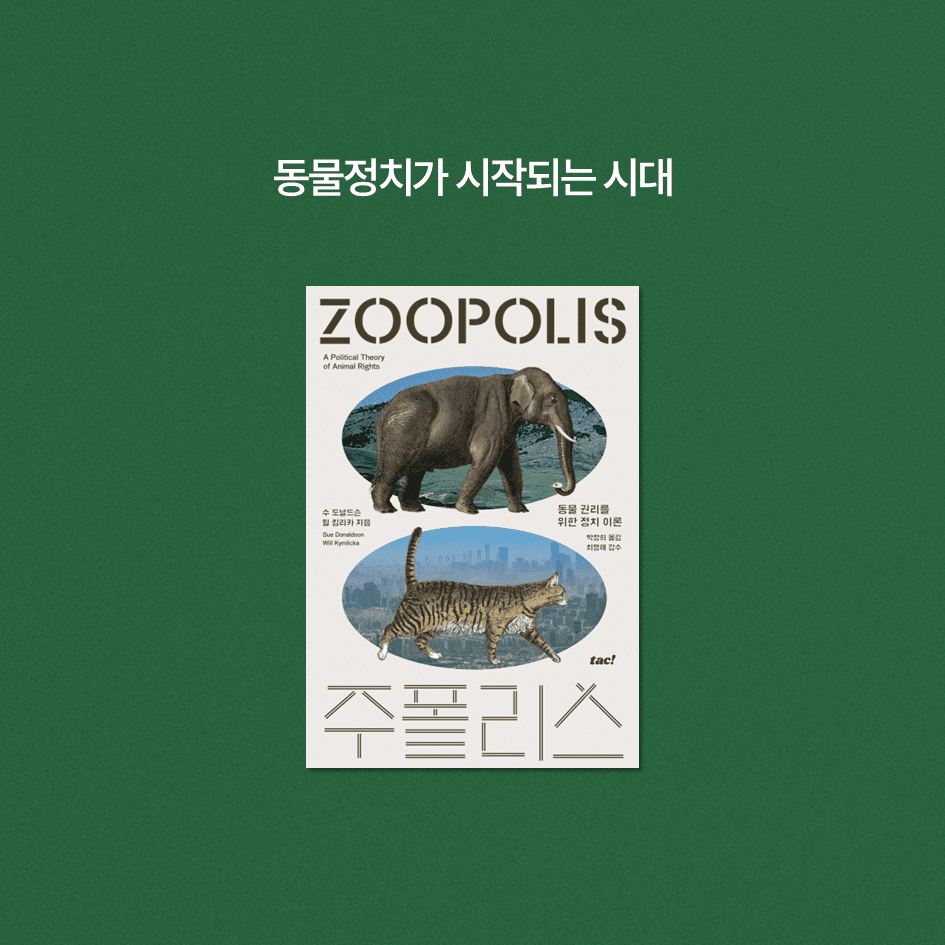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 [펭귄의 서재] 도시는 회색일까, 초록색일까?
- [펭귄의 서재] 열심히 분리배출했는데 결국 소각? 두 개의 법이 만든 아이러니
- [펭귄의 서재] 길고양이에게 ‘주민등록’이 필요하다면?
- [펭귄의 서재] 나무가 인간을 구원한다
- [펭귄의 서재] 이끼가 가르쳐준 생태 언어
- [펭귄의 서재] 내 식탁이 정의로워야 할 이유
- [펭귄의 서재] 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 [펭귄의 서재] 한 플로리스트의 계절 환대법
- [펭귄의 서재] 교실에서 열린 기후소송?
- [펭귄의 서재] 뇌과학자가 밝혀낸 자연의 비밀
- [펭귄의 서재] 오늘의 날씨는 상상이 될까?
- [펭귄의 서재] 횟집 수조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 [펭귄의 서재] 늪에서 배우는 놀라운 생명의 언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