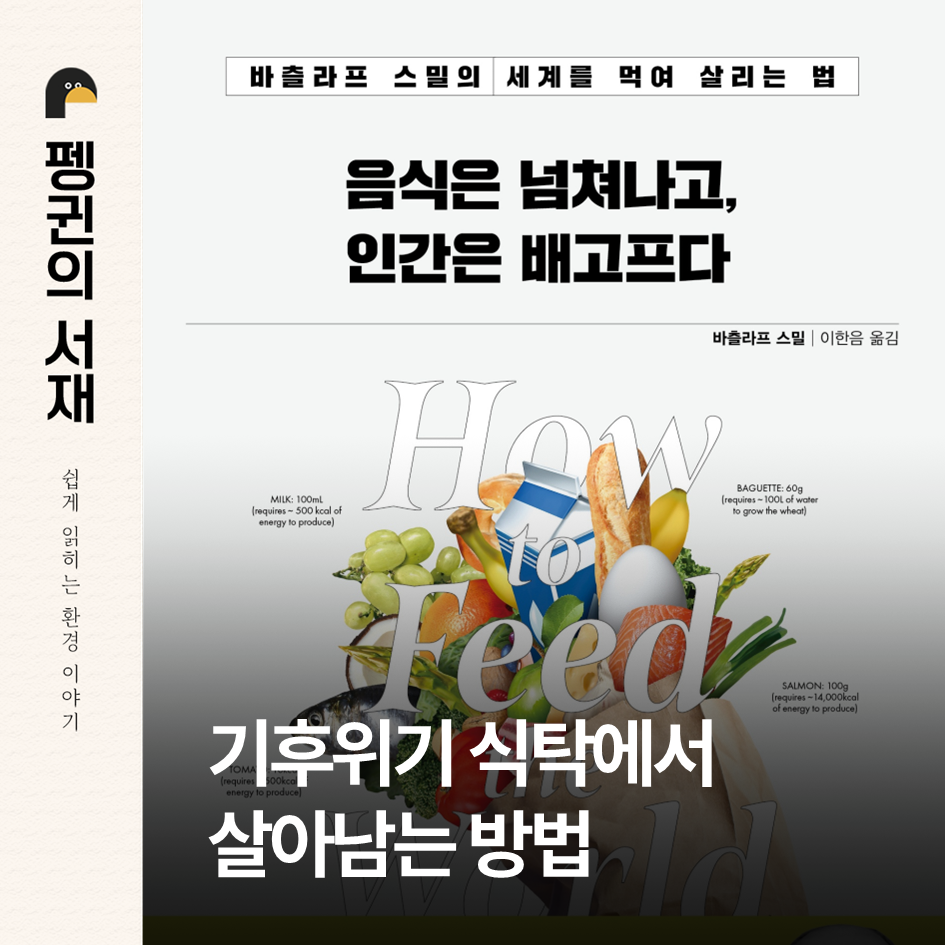
전 세계는 인류가 필요한 양보다 30% 이상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8억 명이 넘는 인구가 굶주린다. 도대체 왜일까?
세계적인 환경과학자 바츨라프 스밀은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그는 식량위기의 본질이 ‘부족’이 아니라 ‘불평등’에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충분히 많이 만들지만, 고르게 나누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식량은 넘친다. 그런데 왜 굶주릴까? 스밀은 식량 생산량 자체보다 ‘누가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한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심지어 미국과 캐나다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도 수백만 명이 식량 불안을 겪는다. 정치적 무관심과 시장 논리가 음식 앞에서도 선별과 배제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수십만 종의 식물 가운데 단 20여 종만 먹는다. 쌀과 밀 두 가지가 인류 칼로리의 35%를 차지한다. 축산 역시 소, 돼지, 닭에 집중돼 있다. 이 획일화된 식단은 기후위기에 취약하고 자원 낭비를 부른다. “인간보다 가축이 더 많은 식량을 소비한다”는 그의 말은 지금의 시스템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렇다면 대안 식단은 현실적일까? 비건, 곤충 단백질, 배양육과 같은 대안 식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스밀은 “극단적인 해법보다 점진적인 개선이 현실적”이라고 말한다. 기술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는 않는다는 의미다. 식문화, 유통, 사회적 수용성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우리가 버리는 것은 음식만이 아니다. 현대 식량 시스템의 또 다른 그림자는 ‘낭비’다. 특히 고소득 국가에서는 전체 식량의 30~40%가 버려진다. 이 낭비는 단지 음식이 아니라, 그것을 기르는 데 들어가는 물, 에너지, 노동, 탄소까지 통째로 허비하는 일이다. ‘먹는 일’이란 이토록 복잡하고 불공평한 것이다.
스밀은 “낭비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식의 전환”이라고 말한다. 식단을 바꾸기 전에 인식부터 바꾸자는 것이다. 그는 식량 문제를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로 바라본다. 거대 농업기업과 무너지는 소농, 풍요 속 낭비와 빈곤 속 기아는 같은 시스템 안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농업을 말하려면, 먹거리의 정의와 분배,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되짚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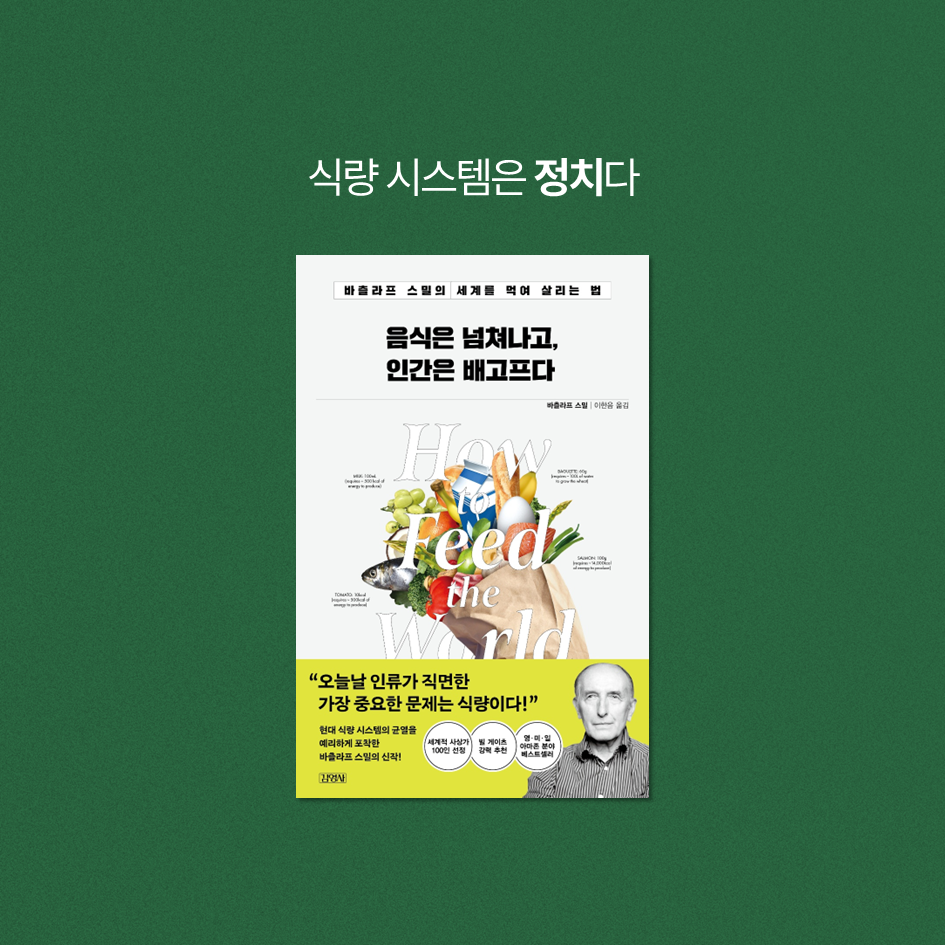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 [펭귄의 서재] 나무가 인간을 구원한다
- [펭귄의 서재] 이끼가 가르쳐준 생태 언어
- [펭귄의 서재] 내 식탁이 정의로워야 할 이유
- [펭귄의 서재] 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 [펭귄의 서재] 한 플로리스트의 계절 환대법
- [펭귄의 서재] 교실에서 열린 기후소송?
- [펭귄의 서재] 뇌과학자가 밝혀낸 자연의 비밀
- [펭귄의 서재] 오늘의 날씨는 상상이 될까?
- [펭귄의 서재] 횟집 수조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 [펭귄의 서재] 늪에서 배우는 놀라운 생명의 언어
- [펭귄의 서재] '기후위기 식탁'에서 살아남는 방법
- [펭귄의 서재] "누군가 하겠지"의 '누군가'가 되기로
- [펭귄의 서재] 염치없는 한 시인의 저작권
- [펭귄의 서재] 기후 우울증 환자 주목!
- [펭귄의 서재] 그때도 지구는 녹고 있었다
- [펭귄의 서재] 감정은 인간과 동물의 공통어
- [펭귄의 서재] 코앞에서 시작하는 순환하는 삶
- [펭귄의 서재] 딸과 아빠가 들려주는 화장품 뒷이야기
- [펭귄의 서재]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식물의 세계
- [펭귄의 서재]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자연’을 찾아서
- [펭귄의 서재] 동물도 슬픔을 느낀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