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서울교육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왕가위벌과 밑들이벌의 산란 경쟁이 벌어졌다.
정확하게는 그늘막 형성을 위해 기둥으로 쓰인 책장 판자에서, 그중에서도 책장 높이 조절을 위해 있는 약 2.5㎝ 깊이의 구멍에서 야생벌들의 산란이 이뤄졌다.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는 지난해 7월 말부터 왕가위벌과 밑들이벌의 출현을 지켜보고 '생물관찰—WhyTV'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 상황을 공유해왔다.
지난달 29일 방문한 테니스장에는 신동훈 교수가 왕가위벌을 보호하기 위해 산란장소를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해놓은 상태였다.


왕가위벌은 온순한 성격으로, 비행소리가 커서 말벌로 오인을 받을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침을 쏘지도 않는다.

신동훈 교수는 "잎사귀를 오려가서 산란방을 만들 때 쓰는 가위벌은 영어로 립커터비(Leafcutter Bee)라고 한다. 하지만 왕가위벌은 가위벌 종류 중에서 유일하게 잎을 자르지 않는 벌이다. 잎 대신 송진을 쓴다"라며 "(가위벌 종류는)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이나 돌 틈 같은 곳을 산란방으로 만든다"라고 설명했다.
왕가위벌의 산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나중에 알에서 나온 애벌레가 먹을 수 있도록 꿀과 꽃가루를 뭉쳐 경단처럼 만든 것을 구멍에 넣고, 알을 낳고, 송진으로 구멍을 밀봉한다.
이렇게 또 먹이를 넣고, 알을 낳고, 벽을 만드는 식으로 구멍 안에 여러 개의 칸을 만들어 산란방을 조성한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교육대학 테니스장에서 산란을 하는 왕가위벌이 포착됐다.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

이때 구멍 안쪽 깊숙한 곳에 암컷을 낳고, 입구 쪽에 수컷을 낳는다. 홍배뾰족가위벌과 같은 천적의 공격으로부터 암컷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다.
신동훈 교수는 "수컷이 먼저 나와서 꿀을 먹고 에너지를 보충하고 있다가 암컷이 나올 때까지 구멍 주위를 빙빙 맴돈다. 암컷이 나오면 짝짓기를 시도하고, 성공하면 생을 마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암컷은 꿀을 먹으면서 산란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다닌다. 산란에 성공하면 암컷도 곧 죽게 된다"라고 전했다.
서울교육대학교 테니스장에서 산란할 곳을 찾아다니는 왕가위벌.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
왕가위벌들의 산란을 모니터링하던 그는 기생벌인 밑들이벌의 출현까지 목격했다.

밑들이벌은 긴 산란관을 이용해 특이한 산란을 하는 종이다.
신동훈 교수는 "등이 벌어지면서 산란관집이 나오고, 산란관을 뻗어서 정확히 왕가위벌 애벌래에 알을 낳는다. 그러고는 배에 달려있는 기다란 산란관을 산란관집에 넣어 감아올려서 등에 있는 홈에 장착을 한다. 마치 무사가 등에 있는 칼집에 칼을 꽂고 다니듯이"라고 설명했다.

밑들이벌이 산란관집에서 산란관을 꺼내 왕가위벌이 산란을 마친 장소에 꽂아 넣고 있다.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
밑들이벌이 꽂아 넣었던 산란관을 다시 산란관집에 넣어 갈무리하고 있다. 출처 : 서울교육대학교 과학교육과 신동훈 교수
꿀벌과 비교했을 때 야생벌은 대부분 개체 수가 적지만, 왕가위벌은 그나마 도심에서 적응을 하고 있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이흥식 박사는 "야생벌 중에 왕가위벌 빼면 거의 다 (서식 규모가) 적은 편"이라며 "왕가위벌은 도시에 비교적 잘 적응해서 상대적으로 흔해졌다. 밑들이벌은 기생성 벌이라 만나기가 쉽지는 않다. 왕가위벌이 한 100마리 있으면 거기에 한 두 마리가 있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서울교육대학교 테니스장의 산란방에서 왕가위벌과 밑들이벌 중 어떤 벌이 나오게 될 지는 계속 지켜보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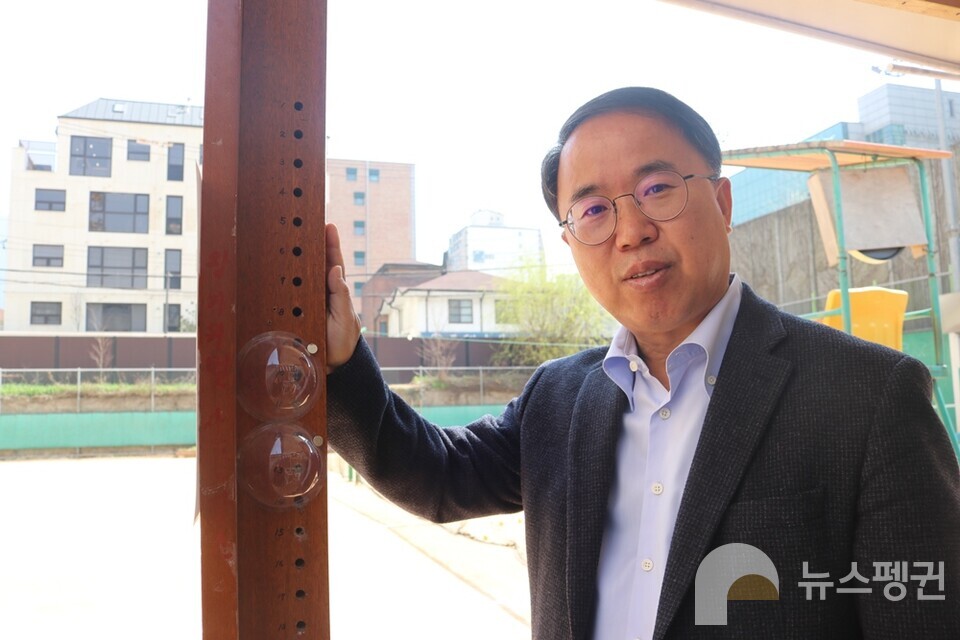
확인을 위해 매일 테니스장을 찾는다는 신동훈 교수는 더 정확한 관찰을 위해 산란이 이뤄진 곳에 돔을 씌워놨다. 이후 관찰 결과도 '생물관찰—Why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야생벌은 생태계에서 꿀벌 못지 않게 중요한 수분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환경연합 최진우 생태도시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야생곤충이나 야생벌 조사 자체가 아직 제대로 활성화가 안 돼있고 어디에 얼마나 분포하고 개체 수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데이터 자체도 미흡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꿀벌이 사라진 원인이 되는 영향은 꿀벌한테만 미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야생에 있는 벌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며 "가축으로 길러지는 꿀벌은 관련 산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큰데, 야생의 수분 매개체 곤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회적 관심도가 미약하다"라고 짚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 꿀벌 실종이 기후위기 탓 아니라는 농식품부…사실은?
- '꿀벌도 사람처럼'…미국, 세계 최초 꿀벌백신 허가
- [창간 5주년 특집] 곤충 소멸,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캘리포니아 호박벌이 '물고기'로 보호받게 된 이유
- '묵었다 가세요~' 이탈리아서 개장한 꿀벌 호텔
- 인간에 의해 '병드는' 벌, 안젤리나 졸리가 온몸으로 품었다
- 도심 속 가위벌 보호… '비하우스' 만드는 방법은? (영상)
- 서울교대 야생벌 산란 전쟁...전반전 결과는? (영상)
- [벌이 받는 오해①] 야생벌은 알아서 잘 지내고 있을까?
- 왜 도심 속 나방을 지켜야 할까?
- '서울교대 야생벌 산란 전쟁' 최종 승자는? (영상)
- '너였어?' 서울교대 쪽동백나무 잎사귀 잘라간 범인 정체
- "Was it you?" Identity of the culprit who cutting leaves from Fragrant styrax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