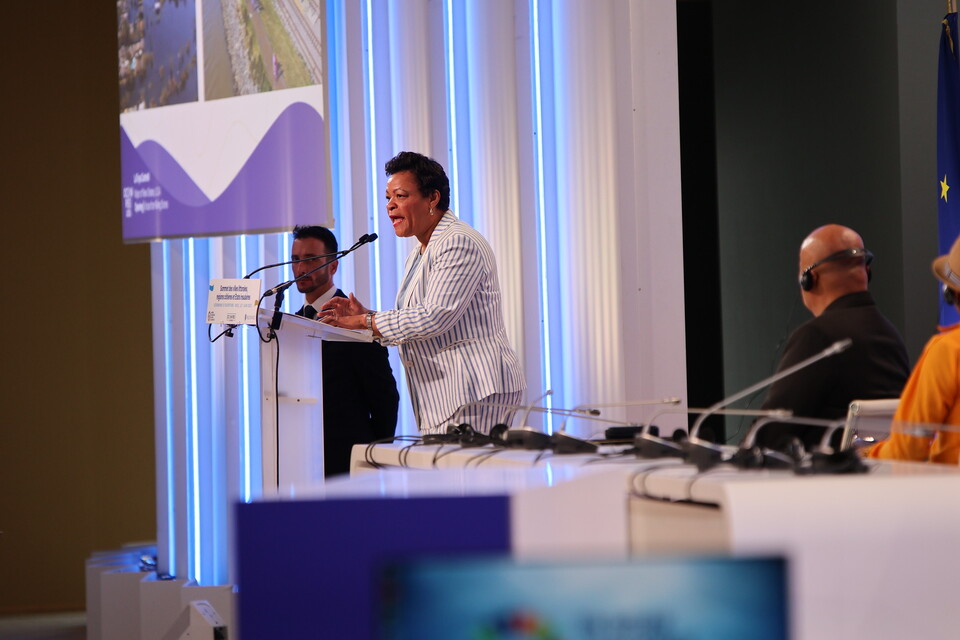
[뉴스펭귄 이동재 기자] 2030년까지 인류가 달성해야 할 17가지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세계 빈곤, 기후, 성평등 등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제시하고 있는 이 목표들 중 14번째 목표는 바로 해양 생태계의 보전이다.
유엔 해양총회(UN Ocean Conference)는 바로 이 14번째 목표를 위해 유엔 회원국과 관련 국제기구, NGO 등이 모두 모이는 해양 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다.
올해 3회차를 맞이한 2025 UNOC의 주제는 ‘해양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이용을 위한 행동 가속화 및 행동 주체 확대(Accelerating action and mobilizing all actors to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the ocean)'. 지난 두 차례의 회의가 실제 국제사회의 정책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올해 회의에서 논의해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을 3가지로 추리고, 이와 관련한 중요한 질문들을 정리해봤다.
1. 주인 없는 바다는 어떻게 보호하나...? "공해 30% 이상 보호구역 지정하자"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업, 채굴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해양보호구역을 늘리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2년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에서 ‘2030년까지 해양 지역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훼손된 30%의 지역을 복원하자는데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 세계 해양 중 완전하거나 고도로 보호된 지역은 2.7%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각 국가의 관할 밖에 있는 공해(High Seas)는 단 0.9%만이 보호되고 있다는 것.
공해는 전 세계 해양 면적의 64%를 차지할 만큼 크고 중요하지만 어떤 나라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아 불법 조업과 심해 채굴 등에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 바다의 상어와 가오리 종의 37%가 멸종위기에 처했으며 매년 약 1억 마리의 상어가 상업적으로 포획되고 있다. 상어 개체수는 지난 50년 동안 70% 이상 감소했는데, 이들의 주요 서식지가 바로 공해다.
이처럼 주인 없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해양 조약(BBNJ)’에 합의했다. 공해를 공동의 유산으로 보고, 국제협약을 통해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조약에는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결의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 조약이 실제로 발효되려면 UN 회원국 60개국의 비준이 필요한 상황. 현재까지 비준을 완료한 국가는 32개 국가로, 겨우 절반 수준에 미친다(한국 국회는 지난 3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협정의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해양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하는 공해에 대한 국제적 약속이 이번 회의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몇 나라가 비준에 동참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2. 막 나가는 미국...어찌할까?
지난 3월 심해 채굴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가 미국 정부에 국제 해저 채굴 허가 신청을 해 국제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간 국제사회는 UN 산하 기관인 국제해저기구(ISA)를 통해서만 심해 채굴 신청을 해왔다. ISA가 심해 채굴이 해양 오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안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UN 해양법 협약(UNCLOS)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다. UN의 국제법 틀 밖에서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TMC의 해저 채굴 허가 신청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해 심해 채굴을 신속 추진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번 TMC의 해저 채굴 허가 신청에 대해 ISA와 국제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제 해역에서의 채굴 허가 권한은 오직 ISA에만 있기 때문에, 미국과 TMC의 행보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미국 당국과 TMC는 심해 채굴 시 발생하는 환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비판 측은 심해 채굴이 해양 생태계에 중대하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UNOC는 TMC의 심해 채굴 신청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오는 7월 ISA의 연례 총회도 앞두고 있는 상황. 이에 이번 회의는 각국이 심해 채굴에 대한 모라토리엄(특정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유예하자는 조치) 지지를 강화하고 국제법과 UN 체계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3. 바다로 흘러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 공감대 형성될까?

지금까지 인류는 80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생산했다. 생산된 플라스틱의 절반가량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제품. 재활용된 플라스틱은 기껏해야 9%에 불과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이로 인해 매년 약 4억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결국 돌고 돌아 바다로 흘러들어간다는 점이다.
비영리 환경 엔지니어링 기관 오션클린업(The Ocean Cleanup)은 매초 동안 약 38kg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총 7500만~1억9900만 톤에 달하는 플라스틱이 해양에 떠다니고 있다고 추산했다.
이 플라스틱은 전체 해양 오염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더 심각한 점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연간 플라스틱 생산·사용·폐기량이 2020년 대비 7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의 생산, 사용, 폐기 방식에 대한 책임 있는 전환이 시급한 가운데 이번 해양총회는 오는 8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국제 플라스틱 협약(INC-5.2) 회의를 앞두고,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전 기조를 결정하는 자리로도 평가받고 있다. 그린피스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이 플라스틱 생산 감축 및 일회용 플라스틱 퇴출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는 건강·공동체·해양·생물다양성·기후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회의 참가국들에 "2040년까지 플라스틱 생산을 최소 75% 감축하는 강력한 글로벌 플라스틱 조약을 지지할 것"을 요구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