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프리카공화국 클라세리 보호구역에서 한 코끼리가 땅에 놓인 두개골 앞에 멈춰 섰다. 코로 뼈를 더듬던 코끼리는 갑자기 큰 울음을 터뜨리며 주변을 뛰어다녔다. 장례식장에서 들을 법한 인간의 곡소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장면은 최근 SNS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돼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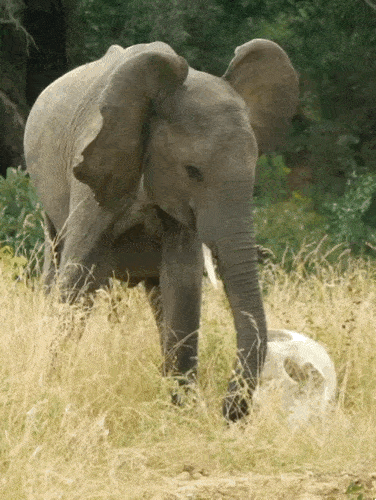
이 장면을 단순히 인간의 감정을 투영한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코끼리가 죽음을 기억과 사회적 유대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인간은 수년간 확인해 왔다. 2005년 케냐 엠보셀리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코끼리 무리에게 코끼리 두개골과 상아, 타 종의 두개골, 나무 조각을 연구진이 차례로 제시했을 때 코끼리들은 동족의 뼈 앞에 유독 오래 머물며 코로 만지고 냄새를 맡았다. 반면 다른 종의 뼈나 나무에는 비교적 짧은 관심을 보였다. 당시 연구진은 코끼리가 동족의 뼈를 구별하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해석했다.
2016년에는 한 무리가 죽은 모계 지도자의 유골을 둘러싸고 코로 살피는 모습이 National Geographic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해에는 남아프리카 런돌로지 보호구역에서 수개월 전 죽은 코끼리의 뼈를 무리가 다시 찾아와 탐색하는 모습이 기록됐다. 몇 달이 지나도 반복되는 행동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의미다.
죽음을 향한 반응은 코끼리만 가진 신기한 능력이 아니다. 침팬지 어미는 죽은 새끼를 며칠간 품에 안고 다니며, 무리 전체가 함께 정지해 시간을 보낸다. 돌고래는 죽은 새끼를 떠받친 채 며칠간 수영을 이어가며 먹이를 거부하기도 한다. 까마귀는 동료의 사체 주변에 모여들어 특유의 소리를 내며 마치 집회를 연 듯한 행동을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생명에서 발견되는 행동은 최근 학계에서 '비교죽음학(Comparative thanatology)'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다. 여러 종을 대상으로 동물이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하는지 비교하는 학문이다. 연구자들은 코끼리의 행동을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기억과 사회적 유대의 표현으로 본다. 죽음을 인지하고 반응하는 동물들의 모습은 인간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며, 인간과 동물 사이의 공감 가능성을 다시 묻게 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