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중입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 대변인실에 전화를 거는 내내 가장 많이 들은 음성이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는 이 자리 담당자의 업무를 '취재지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우연이었을까. 이 자리서부터 대변인실이라고 안내된 모든 번호에 전화를 걸었지만 그 누구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동종업계 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하소연하자 국토부는 원체 전화가 잘 안되는 부처란다. 출입기자가 아니면 연락 닿기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 연락처를 연결해 알음알음 통화하는 편이란다. '국내 언론취재 지원'을 업무내용으로 안내하고 있는 국토부 대변인실에 전화하려면 어렵게 수소문해야 했다. 오전 9시 되자마자 전화를 해보라는 조언도 들었다.
조언대로 오전 9시부터 대변인실과 담당과 담당자에게 번갈아 약 15건이 넘도록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의 행정기관은 담당자가 부재중일 때 다른 담당자가 전화를 당겨 받거나, 일부는 부재중 표시를 보고 회신한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자와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 기자가 애타게 전화를 걸던 9월 마지막 주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걸까.
9월 초 국토부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며 ‘맹꽁이 대체서식지 규제 완화’를 대책에 포함하고, 여러 언론을 통해 "사업지구 밖에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면 포획·이주를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 스트레스를 덜어준다", "맹꽁이에게 유리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맹꽁이 대체서식지는 20년 넘게 실패 사례로 지적돼왔다. 2004년 은평뉴타운 대체서식지는 개체가 자취를 감춘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힌다. 반대로 2023년 용인 서농동에서는 공사 설계를 바꿔 원형 보전을 택했을 때 맹꽁이가 살아남았다. 전문가들은 대체서식지와 맹꽁이 포획·이주는 신중해야 한다며 현행 방식을 지적한다. 실패사례에서 어떤 규제 완화가 가능했을까.

묻고 싶었고, 물어야 했다. 맹꽁이는 기후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이다. 왜 처음 기후부와 논의할 때 맹꽁이를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자고 했는지, 어떤 생태적 근거와 정보로 맹꽁이에게 유리하다는 답을 내놨는지, 국토부가 언론에 제공한 설명은 무엇을 기반으로 했는지.
결국 대변인실 담당자로 알려진 이메일 주소를 수소문했다. 맹꽁이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공개 질의서를 작성해, 수신인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변인실 앞으로 이메일을 보냈다. 회신 요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였다.
예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 이유를 확인하고자 최근 대변인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취재지원 업무로 안내된 그 연락처 담당자는 이날도 '회의 중입니다'로 응답을 대신했고, 수차례 끝에 다른 담당자와 전화가 닿았다.
"맹꽁이는 기후부 소관 아닌가요?" 멸종위기종을 주로 관리하는 부처가 기후부 아니냐는 질문이 돌아왔다. 멸종위기종을 주로 관리하는 부처가 기후부여서다.
멸종위기종은 기후부 혼자 보호하고 관리하는 게 아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보호 주체를 '국가·지방자치단체·국민'으로 규정한다. 개발과 이주, 대체서식지 조성을 추진하는 국토부 역시 그 책임에서 예외가 아니다.
국토부는 '맹꽁이 대체서식지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기후부와 협의를 거쳤다. 기자는 맹꽁이를 물으려는 게 아니라, 맹꽁이 대체서식지 규제 완화 방식이 맹꽁이한테도 안전할 거라고 말한 국토부의 근거를 묻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답이 오지 않은 이유는 질의서를 보낸 이메일 담당자가 현재는 공석이어서다. 공개질의는 독자만 읽은 셈이 됐다. 대변인실은 "담당과에 직접 문의할 수밖에 없다"며 "대변인실로 보내도 결국 담당과로 전달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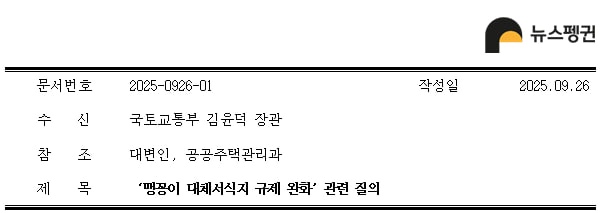
이 질문에 누가 답해줄 수 있을까. 누가 답해야 할까.
개발예정지에서 맹꽁이가 확인되면 주로 서식지와 가까운 곳 또는 사업지 밖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해 맹꽁이를 포획 및 이주한다. 2021년에는 LH가 문화재청과 협약을 맺어 조선왕릉을 맹꽁이 대체서식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 보도되기도 했다.
혹자에게 맹꽁이는 불청객이다. 이런 현상을 두고 '촉법동물'이라는 표현이 종종 보인다. 멸종위기종을 뜻하지 않게 마주쳤는데 개발지와 서식지가 겹치는 등 인간 관점에서 방해요소가 됐을 때 '멸종위기종'이라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함의를 두고 '촉법소년'에서 일컬어진 말이다.
맹꽁이는 인간을 방해한 적 없다. 순서를 따져보자. 맹꽁이가 사는 곳에 인간이 살 곳을 지으려해서 생기는 문제다. 반대로 맹꽁이가 인간에게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겠으니 당신들은 당신들 모여있는 곳에 살라'고 포획해 이주한다면 문제없이 삶을 꾸릴 수 있을까. 맹꽁이가 인간을 비유해 말한다면 어떻게 표현할까.
야생동물이 야생에서 자연히 죽는 건 누가 책임질 일도, 슬퍼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인간과 함께 살다가 인간 때문에 집을 잃어 죽고, 개체수가 급감한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어느 날 한 전문가에게 '이 작은 생물 하나 사라지는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면 좋으냐'고 물었다가 지적을 들은 적이 있다. 너무 당연한 윤리적인 이야기라 전문가가 말해줘야 아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인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이 당연한 인식 밖으로 산적한 문제들을 뉴스펭귄은 취재하고 보도한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분투하는
뉴스펭귄에 후원으로 힘을 실어주세요.




